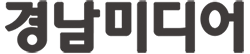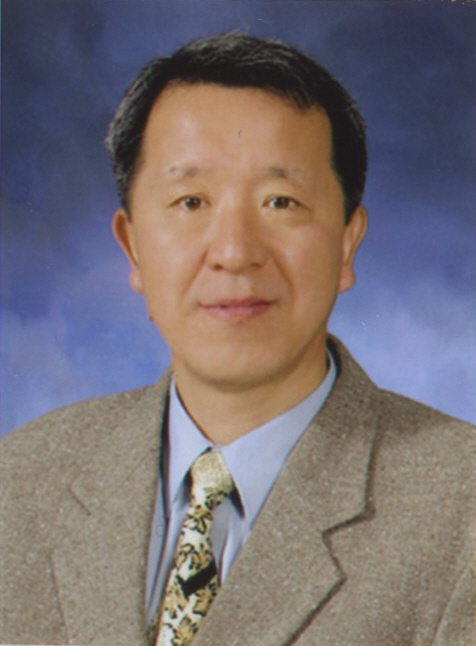
한적한 시골에서 혼자 살다 보면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렌다. 가족이 방문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때면 집 단장에 들어간다. 잔디를 깎고 주변 화단을 정리한다. 비에 쓰러진 꽃들을 곧바로 세우기도 하고 비 오는 동안 훌쩍 커버린 풀들도 베어내며 감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도록 플라스틱 의자도 몇 개 갖다 놓는다. 이런저런 준비가 끝나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가다듬는다. 이런 준비는 모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고장 난 가로등을 수리하는 일이다.
우리 집 입구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 이 가로등에는 ‘정용우 기증’이라는 글자가 페인트로 크게 쓰여 있다. 아름다움이라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투박한 글씨체다. 게다가 일부 글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상태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다. 사실 나는 이 가로등을 기증했다는 기억도 없다. 아마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내 이름으로 기증하신 모양이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가로등은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지만 우리 집 입구에 설치된 가로등은 불빛을 발할 수 없어 주위는 어둠이다. 이 사실을 동네 이장 형님에게 통지를 했더니, 이장 형님 말씀이 시골에서는 이 동네에서 가로등이 여러 개 고장이 나야만 수리기술자를 초빙할 수 있단다. 한 개의 가로등이 고장 났다 해서 이곳 시골까지 곧바로 수리기술자를 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장 형님의 말씀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밤이 되면 별수 없이 어둠 속에서 참고 지낸다.
엊그제 해질 무렵 아내가 이곳 시골로 왔다.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서면 먼저 집부터 둘러본다. 모든 게 잘 정리정돈 되어있어 좋다고 이야기해주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집을 둘러본 후, 가져온 짐들을 집 안으로 들여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밖은 어둑어둑해진다. 그때 내가 이야기한다. 가로등이 고장 나서 이렇게 밖이 어둡다고... 실외등을 켤까냐고... 아내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좀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둠이 좋네.” 어둠이 좋단다. 듣고 보니 그 말이 이렇게 새삼스러울 줄이야. 매일 환하게 빛을 발하는 가로등 탓에 지금까지 어둠을 별반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생각이 스친다.
어두운 밤도 환한 낮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어두운 밤과 환한 낮을 번갈아 가며 맞아야 우리 몸과 마음이 생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게다가 어둠은 우리를 고요히 가라앉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위대한 그 어떤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밤의 어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는 약이라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
사람에게만 밤의 어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동물, 식물에게도 밤의 어둠은 필요하다. 붙박이 식물에겐 특히 그런 것 같다. 나는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 가로등 바로 아래 심어져 있는 홍단풍나무에서 그 사실을 확연히 느낀다. 이 홍단풍나무 외에 우리 집 출입구 반대편에 청단풍나무도 함께 심었는데 유독 이 홍단풍나무만 비실거리고 있다. 성장도 더딜 뿐만 아니라 홍단풍나무로서의 그 본래적 색깔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한다.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쉬거나 잠 좀 자고 나면 다른 나무처럼 제대로 성장하고 잎 색깔도 멋지게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태고 적부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 근래 인간이라는 게 나타나 사시사철 밤낮없이 빛을 쏘아대고 있으니 정말 배려나 예의라고는 모르는 것들이라고 성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밤의 어둠에 그 의미를 부여해 보지만 습관적으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곧 다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가로등을 수리하게 될 것이다. 이장 형님 말씀대로 몇 군데 더 가로등이 고장 나야 하니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나는 밤의 어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루쉰(魯迅)의 ‘밤의 노래’다. “사람의 언행은 낮과 밤, 태양 아래서와 등불 아래에서 달라진다. 밤은 조물주가 만든 신비의 이불이다. 밤은 모든 사람을 덮어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밤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위의 가면과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끝없는 어둠의 솜이불 속으로 알몸이 되어 들어가게 한다. ... 군자들은 전등 아래 있다가 어두운 밤으로 돌아서는 순간, 기지개를 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