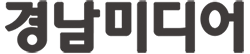가을은 늘 속절없이 간다. 삶이 그렇듯이... 2022년 가는 가을을 잠시 붙들려고, 아니 배웅하려고 길을 나선다. 지난 여름의 길고도 무덥던 시간들이 선물처럼 찾아온 가을하늘에 밀려 지금은 제법 깊숙이 가을 속으로 와 있는 시간. 늘 그렇다. 산다는 건 앞길로 보면 까마득하지만 걸어 온 길을 돌아보면 꿈결 속이다. 해서 붙들지 않으면 속절없이 떠나가는 것이 시간이자 이 가을이다.
서울에서 함양까지... 서둘러 길을 나섰지만 출근길 차량은 중부선 초입부터 긴 줄을 선다. 이천, 곤지암, 호법... 황금색 들판이 다시 먼 고향의 향수로 도로변에 펼쳐져 있다. 휴게소 잠시 들러 자판기 커피로 몸을 깨우고 누님과의 동행길을 간다. 다시 두어 시간을 달려 인삼랜드 휴게소, 형님이 좋아하셔서 늘 들러는 꽈배기 가게는 주인이 바뀌었다. 코로나 시절 매출이 신통치 않아 지난번 들렀을 때 사업 종료한다고 했던 것 같다. 젊은이가 만들어 주는 꽈배기는 모양이 전혀 아니다.
고향집 도착해서 기다리는 형님 내외분과 점심을 나선다. 수동의 뒷골목 국수집은 늘 그대로다. 낮은 천장 아무렇게나 말아 주는 듯한 국수와 비빔밥이 왜 어머니 손맛처럼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어도 늘 이 맛에 찾나 보다. 고구마 박스 아들들에게 보내는 형님 트럭을 따라가다 잠시 들른 우체국, 왼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 하나 없는 우체국 직원이 손님처럼 반긴다.
돌아올 때는 오래 전의 초등학교 등하교길을 따라 귀가한다. 학교는 진작에 폐교되어 공장이 되었다. 올올이 배인 먼 날의 기억들이 폐허처럼 버려져 이제는 기억 속으로 숨어버린 얘기들을 스치며 지나간다.
오후는 시골집에서 쉬다가 냇가 뚝방길을 따라 형수 누님 셋이서 산책을 나선다. 잘 정비된 뚝방, 시골 인구는 감소하고 느릿한 마을이 되어가지만 농로와 강변은 더 넓고 깨끗하게 정비되고 있다. 오후의 햇살을 받고 들국화들이 지천으로 핀 강변을 걷는다. 시골의 해는 늘 비껴뜨고 비껴진다. 억새 풀에 역광으로 비치는 햇살이 하얗게 부서진다.
동생 호출로 저녁을 하러 읍내로 향한다. 읍내 어느 뒷골목 싸고 푸짐한 돼지고기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보름달이 떴다. 옅은 주황색으로 이제 막 동산에 오른 보름달이 아련한 향수를 끌어낸다. 그래 어릴 적 늘 보던 무한한 미래와 꿈을 얘기해 주던 그달이 어느새 지나버린 삶을 아직도 무심한 듯 저리도 비출 줄 몰랐다.
미지의 무한한 꿈을 약속하는 듯 하던 달이 훌쩍 지난 시절로 건너뛰는데 걸린 시간은 잠시이다. 구비구비 돌아보면 아득한 세월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하면 감사한 삶이었다고, 갚을 수도 담을 수도 없는 충만한 달이었다고, 지금도 감사로 충만으로 눈물로 전하는 달의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을 게다.
왜 서울의 달과 시골의 달은 같은 달인데도 다른 느낌일까. 서울의 달은 늘 원래 시골에 있어야 할 달이 잠시 출장 나와서 생경하게 저 멀리서 머뭇대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그럼에도 그 반가운 변함없는 달에 연민 같은 그리움이 잔뜩 묻어난다.
이젠 빈 집만 자꾸 늘어가는 시골동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는 너무도 오래 전, 60이 젊은 나이인 이 동네, 늘 흐르던 앞 개울에 물이 마른 지도 오래 전, 어릴 적 길이 날 정도로 말끔하던 앞 뒷산은 이제 우거져 접근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사람도 산천도 모두 변했는데 동산에 뜬 달만 그대로이다.
고향을 오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새벽과 노을에 강변 뚝방길을 걷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안개 낀 강변을 걷는다. 뚝방길에 지천으로 핀 들국화. 참 자연은 이리도 언제 어디서든 축제를 연다. 어느 때는 달맞이꽃으로, 어느 때는 나팔꽃으로 봄 여름 가을 늘 그렇게 뚝방길은 무대를 달리 꾸민다.
가을은 온 천지에 낭만이 가득 열리는 계절이다. 이제는 비어버린 동네 어귀의 외딴집, 감나무 몇 그루만 듬성한 감들을 달고 있다. 주인은 주변 요양원에 계시단다.
아침 산책 후 형수님이 끓여주시는 매콤한 감자 북어국을 가을향수처럼 채우고 창원 작은형 댁으로 향한다. 이제 모두 팔순을 넘기신 나이, 귀도 눈도 기능이 나약하게 된 분들. 주름과 얼굴에 깊이 배인 세월과 정들, 고향의 품이나 형님 형수들에게서는 늘 구수한 누룽지 내음, 어떨 땐 술익는 가을 내음, 어떨 땐 느리게 흐르는 강에서 풍기는 저녁노을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고향을 가는 게다. 스러져 사라져 가버릴 시간이라도 우린 오늘 여기를 살아내는 것 아닌가. 늘 오르는 수락의 저녁노을처럼.
마산 횟집에서 형님 두분 내외와 부산 서울 누님 한 식탁에 앉아 회와 매운탕을 가득 먹고 오는 길에 마산항에서 낚시로 하는 멸치잡이를 보고 형님댁으로 귀가, 작은 누님이 사 온 킹크랩으로 다시 배를 눌러 채운다.
다시 고향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단성 추어탕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귀가해서는 백원짜리 고스톱을 두어 시간 하고 잠을 청한다. 육계장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침마다 북어국 따로 끓여주시는 형수님이나 자다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 있있더니 “왜 잠이 안 오냐”며 형님이 건네주는 티비 리모컨이나, 육순이 넘었는데 아랫 동생은 아이인가 보다. 해서 고향의 밤은 길지도 않고 고향의 밥은 늘 진한 그리움이 된다.
우린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여행자. 삶이 권리와 의무로 선택적 행복과 불행 속에 자전거 바퀴처럼 돌 때는 그 한 날이 버거웠다. 그 사이 사이에 구름 사이로 달빛 보듯 다가서는 삶이 전하는 즐거움들은 늘 선물이 되기도 했었다.
귀경길에 전유진 노래를 ‘꽃길’을 듣는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가요~ 비단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아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었길래 그게 꽂길이다. 이 노랫말은 다시 사랑을 희망하는 노래다. 그 길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웠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